삶의 강물, 그리고 나 자신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읽는 이의 삶의 단계마다 다른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싯다르타의 고뇌와 방황이 진리에 대한 고민으로 멋지게 보일수도 있지만, 삶의 절반을 살아낸 지금, 그의 고통은 더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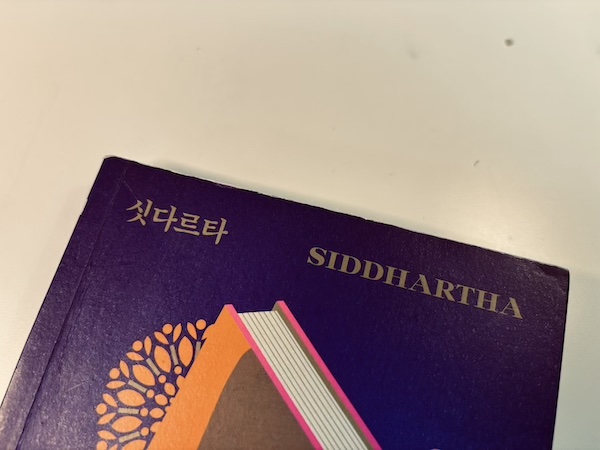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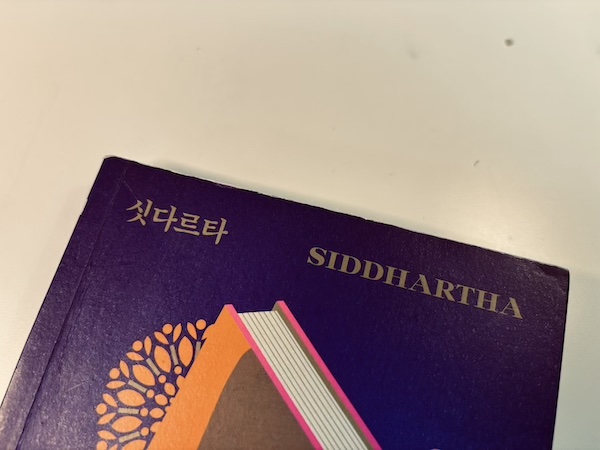
삶의 강물, 그리고 나 자신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읽는 이의 삶의 단계마다 다른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싯다르타의 고뇌와 방황이 진리에 대한 고민으로 멋지게 보일수도 있지만, 삶의 절반을 살아낸 지금, 그의 고통은 더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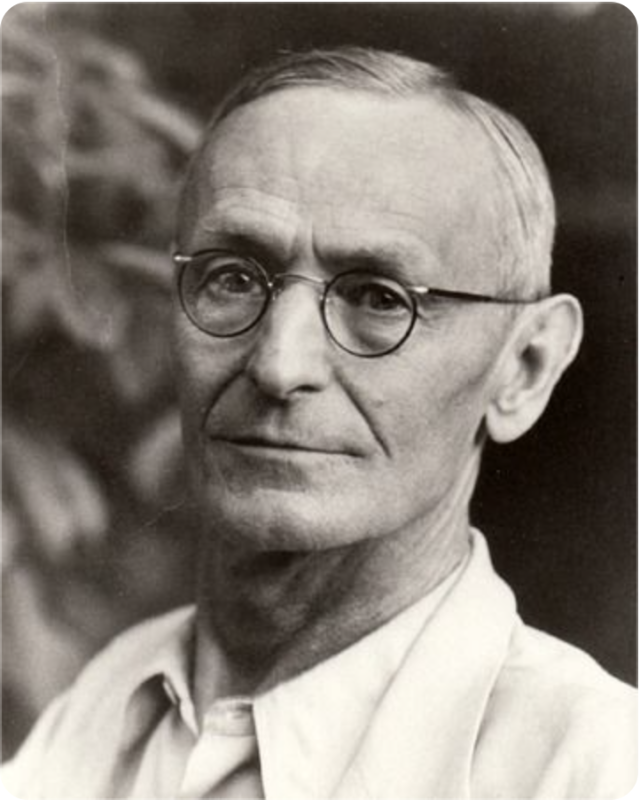
‘경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보다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고 책임이 덜 느껴질지 모른다.’ 알베르투스 2세의 이 문장은 헤르만 헤세의 위대한 역작 『유리알 유희』의 서문을 장식하며, 독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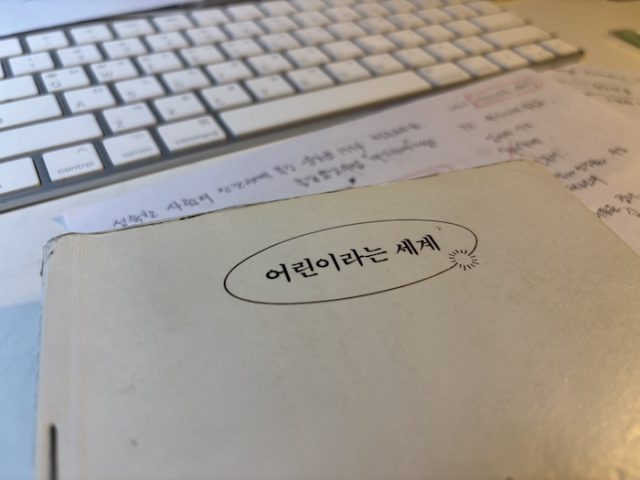
『어린이라는 세계』를 다시 읽으며, 아이들과 나눈 온도의 대화 2025년 여름, 『어린이라는 세계』를 다시 펼쳤다. 김소영 작가의 이 책은 처음이 아니다. 처음 만난 건 2020년, 한창 코로나로 일상이 얼어붙었던 시기. 그때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나는 육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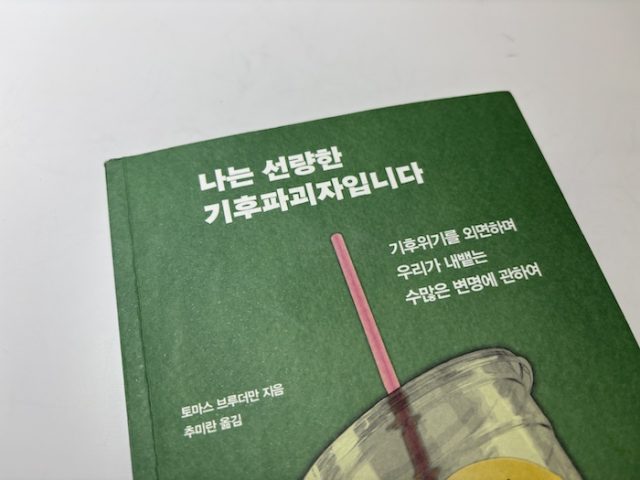
『나는 선량한 기후파괴자입니다』.제목부터 아이러니하다. 책의 저자 토마스 브루더만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간행동과학 전문가다. 이 책은 단순한 환경서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심리, 그중에서도 사회나 집단 속에서 인간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바탕으로, 왜 사람들이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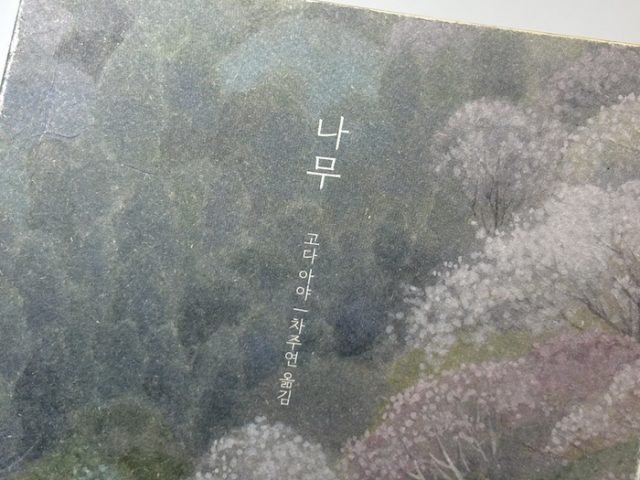
‘나무’라고 읽고 ‘사람’이라고 쓴다. 굽은 편백나무의 내재적 이유 중학교 3학년 딸아이가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머릿속엔 별별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엄마, 시험 때문에 […]

에드워드 호퍼와 레이먼드 카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 『대성당』을 읽고 떠오른 이미지 최근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대성당』을 읽었다. 읽는 내내 한 화가의 이미지가 자꾸만 겹쳐졌다. 바로 에드워드 호퍼. 왜 그가 떠올랐을까, 처음에는 명확하지 […]

1. 서론: 체계이론의 등장과 시사점체계이론(system theory)은 인간을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상호작용(interaction) 속의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가족치료(family therapy)에서 체계이론은 개인의 문제를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의 결과로 바라보게 하며, 원인-결과의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점은 […]

도서관을 나서던 오후 5시 45분, 콘크리트 벽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가 기울며 황금빛으로 물든 햇살이 벽면을 타고 퍼져나가고, 그 위로 깊고 짙은 그림자가 얹혔다. 빛과 어둠이 맞닿은 경계에서 색의 대비가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

개학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 꼭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했지만, 마음이 앞선 상태에서 그림을 시작했다.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제서야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하는 작은 자책이 스쳤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정말 짧고 […]

도스토엡스키의 <죄와 벌>의 루쥔은 자기 합리화가 철저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고통받는 라스콜니코프와 달리,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밀양의 가해자는 신의 용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