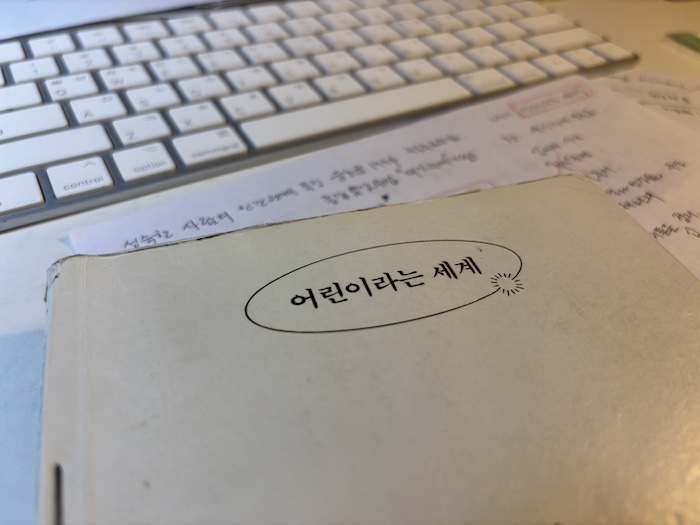『어린이라는 세계』를 다시 읽으며, 아이들과 나눈 온도의 대화
2025년 여름, 『어린이라는 세계』를 다시 펼쳤다. 김소영 작가의 이 책은 처음이 아니다. 처음 만난 건 2020년, 한창 코로나로 일상이 얼어붙었던 시기. 그때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나는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며 ‘엄마표 수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까. 『어린이라는 세계』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읽었던 책이었다.
그 당시엔 주로 ‘엄마의 시선’으로, 그리고 지식 전달자의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다. 추천 도서를 메모해 두고, 에리히 캐스트너의 『에멜과 탐정들』을 사서 큰아이와 함께 읽어보려 했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 실패감이 이 책에 대한 인상까지 흐려버렸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미술치료와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며, 아이들과 그림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다시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었을 때, 책이 품고 있는 문장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이제 나는 아이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그 얼굴 못생겨져서 싫어요”
얼마 전, 그림책 수업 시간에 건우가 고구마 먹는 장면을 그리는 일이 있었다. 고구마를 크게 한입 베어문 얼굴의 표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 입 모양이나 주름을 강조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건우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그 얼굴 못생겨져서 싫어요.”
나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으니까 이제 채색하자”며 넘어갔다. 그런데 이 수업 이야기를 원장 선생님과 나눴더니, “왜 애가 싫다는데 그냥 받아줘? 이미 못생겨졌으니 멋지게라도 그리게 설득해야지”라고 조언하셨다. 나는 당황했다.
그 말이 한동안 마음에 남았다. 나는 너무 아이들의 감정에 끌려가는 걸까? 훈육도 못 하고, 기준도 약한 걸까? 하지만 『어린이라는 세계』를 다시 읽으며, 김소영 작가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비슷한 결을 발견했다. 아이를 친구처럼, 때로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 내가 선택한 방식도 결코 미성숙하거나 부족한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마음, 그리고 다시 만나는 기쁨
최근엔 내가 수업하던 요일이 변경되면서 몇몇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이 많이 든 아이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허전했다.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김소영 작가가 코로나 시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며 느꼈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나의 감정과 겹쳐졌다.
“나는 마음이 헤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이 참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그 아이들 중 윤이가 다시 내 수업 시간으로 옮기게 됐다는 것. 더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다니, 우리의 재회가 설렌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이겨먹는 것’이 아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왜 아이를 이겨먹지 못해?”
“왜 그렇게 아이 말만 들어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와의 관계는 누가 더 우위에 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최근 상담심리학 종강수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떠올랐다. 설득에는 로고스(논리), 파토스(감정), 에토스(인격)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원장 선생님의 방식이 로고스에 가까웠다면, 나는 파토스를 지나 에토스, 즉 신뢰와 진정성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말이 아니라 내 태도와 온도로 설득하는 방식.
“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 성숙한 관계를 향해
상담심리학 종강 특강에서 교수님이 해주신 마지막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한 관계입니다.”
이 말이 참 좋았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다. 내가 편하고, 아이도 편할 수 있는 수업.
그 속에서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나도 아이에게 조금 더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
이제는 『어린이라는 세계』를 단순한 어린이에 관한 책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과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인 것 같다. 우리도 예전에 어린이었고, 어쩌면 내 안에 아직도 다 크지 않은 어린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 책은 아이를 만나고, 아이와 함께 ‘살아내는’ 어른에게 주는 깊은 위로이자, 조용한 다짐의 책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아이들과의 수업에서, 그 다짐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