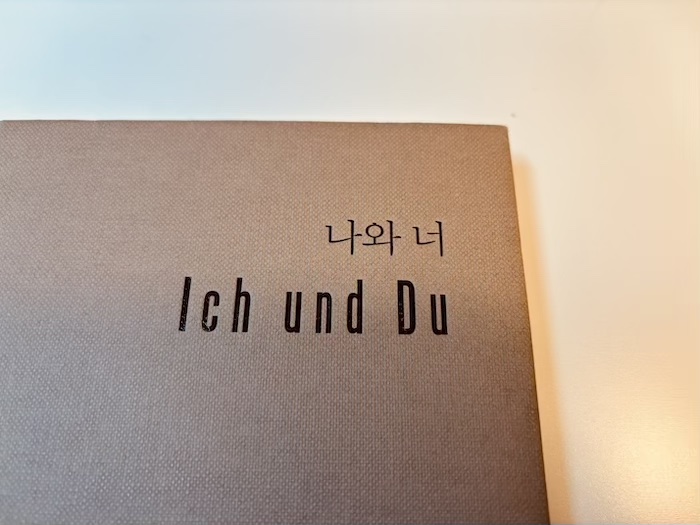부버와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니체: “나-너” 철학과 구원의 만남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나와 너(I and Thou)는 인간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그리고 인간과 신 사이의 깊은 관계를 다룹니다. 부버의 사상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특히 <죄와 벌>에서 나타나는 죄, 고통, 구원의 주제와 흥미로운 접점을 이룹니다. 이 글에서는 부버의 “나-너” 철학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와 소냐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니체의 초인(Übermensch) 사상과 비교한 부버의 인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버와 도스토옙스키: 인간관의 접점
부버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인간 실존의 깊은 모순과 고통을 공감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이분화하지 않고, 고뇌와 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로 그렸습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와 소냐의 관계는 부버가 말하는 ‘나-너 관계’의 초기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소냐는 라스콜니코프를 정죄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계를 통해 그가 자신을 직면하도록 돕습니다. 부버는 인간이 진정한 관계를 통해 초월적 실재(신 또는 절대자)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라스콜니코프가 소냐를 통해 회복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 부버의 ‘나-너’와 ‘나-그것’ 철학
부버의 철학에서 핵심은 ‘나-너 관계’와 ‘나-그것 관계’의 대립입니다. ‘나-너’ 관계는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되며, 서로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나-그것’ 관계는 도구적이고 객체화(thingification)된 관계를 뜻합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는 고리대금업자 알료나를 살해할 때 그녀를 객체화된 ‘그것’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소냐와의 관계를 통해 그는 인격적인 ‘너’와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고,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부버가 설명한 인간 회복의 모델과 일치합니다.
- 니체의 초인과 라스콜니코프의 초인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을 초인이라 믿으며 기존 도덕 규범을 초월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사에서 특정 개인(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은 순종하면 살아야 하고 법률을 뛰어넘을 귄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반면 비범한 사람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방삭으로 법률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피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같은 인물은 그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사의 도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시아 컴플렉스(Messiah Complex)는 스스로를 역사의 필연적 주체로 여기며, 자신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 존재라고 믿는 심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료나를 살해한 후,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초인 이론의 허구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니체의 초인 사상과 흥미롭게 대비됩니다. 니체의 초인은 기존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율적 존재로 정의됩니다. 반면 라스콜니코프는 자기 논리를 증명하려다 실패하고, 죄책감 속에서 회개를 향한 여정을 걷습니다.
- 부버와 도스토옙스키의 관계를 통한 구원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자주 다루었으며, 특히 선과 악의 갈등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부버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이중성(Duality)에 대한 통찰을 받아들여, 인간이 단순히 ‘객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부버의 사상에서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초월적 존재(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보여준 구원 서사와 닮아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따뜻함과 구속되지 않은 사랑을 경험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스콜니코프는 부버의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만남(Meeting)’을 실현하게 됩니다. 소냐는 그를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계(Relation)로 그가 스스로의 죄와 대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부버가 주장하는 인간 회복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반면 부버는 “나–너” 관계를 깨뜨린다는것은 인간과 신 또는 인간과 타자 간의 상호작용과관계를 상실하고, 경계와구분이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일성 또는 융합이 강조되며, 부버가 말하는 진정한 관계의 본질인 상호적 만남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합일 (Unification)과 동일성(Identification)은 “나–너” 관계의파괴를 통해 상호적 존재의 본질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나-그것”과 “나–너“ 관계를 모두 경험하며, 이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부버는 이 두 가지 관계가 모두 필요하지만, 진정한 존재의 깊이는 “나–너“ 관계를 통해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 자유의지와 책임
도스토옙스키는 자유 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이 자유가 인간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버는 인간이 “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고, 그 관계를 통해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버에게 있어서 “너”와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진정성을 나타내며, 이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관계에 근거합니다.
부버는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자유 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관계 중심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너”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고, 그 관계를 통해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버에게 있어 인간의 자유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실현되며, 이는 인간 존재의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결론
부버의 철학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인간 존재와 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제공합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초인 이론과 부버의 ‘나-너’ 관계는 인간과 타자, 그리고 초월적 실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원과 변화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세 철학적 관점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고통을 직시하고, 관계를 통한 구원과 변화의 힘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