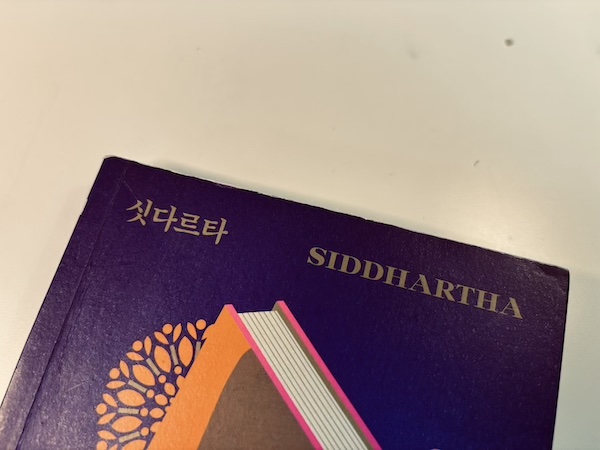삶의 강물, 그리고 나 자신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읽는 이의 삶의 단계마다 다른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싯다르타의 고뇌와 방황이 진리에 대한 고민으로 멋지게 보일수도 있지만, 삶의 절반을 살아낸 지금, 그의 고통은 더 이상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번뇌를 읽을 때, 비로소 이 소설이 저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고통은 다름 아닌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싯다르타는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해 번뇌와 근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감정이 아들이 없었을 때의 고결하고 평온했던 행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아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본능입니다.
더 나아가, 싯다르타는 아들을 위해 열 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정작 아들이 겪어야 할 운명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덜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딸을 위해 밥을 준비하고 학업을 돕는다 해도, 정작 딸이 겪어야 할 친구 관계나 학업 스트레스를 대신해줄 수 없는 부모의 무력감. 싯다르타가 아들의 운명을 덜어주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듯, 저 또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이러한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번뇌가 인간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이자 탁한 샘물, 시꺼먼 뻘물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사랑이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질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한 번쯤은 맛보아야 할 짜릿한 쾌락이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바보 짓’이었죠. 이 깨달음은 쾌락과 고통, 그리고 바보 같은 집착까지도 삶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강물을 통한 깨달음의 통합
싯다르타의 여정은 단순히 한 인간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여정은 친구 고빈다와의 만남을 통해 완성됩니다. 싯다르타는 ‘스스로 깨달음을 찾는 자아’를, 고빈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 두 인물이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두 반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속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찾던 헤세와 사색과 글쓰기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던 헤세의 내면적인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은 완전한 윤회나 열반이 아닌, ‘완전히 성스럽지도, 완전히 속되지도 않은’ 인간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에서 싯다르타는 뱃사공 바수데바를 만납니다. 바수데바는 말을 통해 가르치려 하지 않고, 오직 강물 소리를 듣고 강과 함께 살아갑니다. 싯다르타는 그를 통해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존재 자체를 통해 얻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바수데바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말 없는 진리를 깨달은 ‘완전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마야와 시간, 그리고 보편적 진리
결국 싯다르타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에게 마야(Maya), 즉 세상의 환영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통해 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속에 함께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었죠.
이러한 헤세의 통찰은 훗날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사상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보이스가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라고 선언했듯, 헤세 또한 “죄인 안에는 이미 미래의 붓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위대한 사상가는 깨달음과 창조적 잠재력이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행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형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싯다르타』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싯다르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번뇌와 사랑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 안의 붓다는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나요?